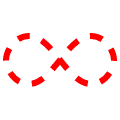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불운을 겪고 있지만, 나는 살아야 하는 엄청난 행운을 갖고 있습니다.’ 희귀한 불치병(루게릭병)으로 36세에 세상을 떠난 야구 선수 루 게릭의 메세지다. 그는 스포츠맨으로서 미국철학의 표상이다. 미국철학이 지향하는 ‘영웅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미국 철학은 고정된 진리보다 쓸모있는 진리를 주장한다.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것이 없는 변화무쌍한 복합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단순한 단일체가 아니라, 수많은 층위와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복잡한 서사시다. 이처럼 우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험이나 행동으로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철학을 ’실용주의’라고 부른다.
스포츠나 운동도 그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실패와 도전이 거듭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성장한다. 사람들은 스포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깨달아 신체적 활동으로 다시 태어나고 재창조된다. 이처럼 스포츠도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미국철학과 공통점이 많다. 특히 스포츠는 그 결과가 운도 있어야 하지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는 스포츠를 보고 하면서 스포츠의 창의적 역동성을 강렬하게 경험한다. 그 의식의 총체적 흐름의 부산물로 자존감이 상승된다. 자신의 신뢰는 자아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폭발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미국인들은 스포츠의 ‘변혁적인 힘’을 무자각한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최종 결과이며, 점수, 기록, 통계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만 챙겨본다. 이런 결과 중심적 관점의 오류는 스포츠를 나 자신을 알기 보다는 내 자신을 증명하는 장소로 만든다. 그래서 스포츠가 ‘대리만족‘이나 일종의 마약으로 전락될 수 있다.
‘법률과 책과 우상을 창 밖으로 던져버리고 자기 안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라‘ 고 철학자 에머슨이 외친다. 이 주장처럼 스포츠가 내포하는 ‘의지의 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도약’이 주어진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만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이끈다.
인생에서 ‘구경꾼‘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보다 완벽한 자아를 형성한다. 그 불굴의 의지가 체념의 삶과 희망의 삶의 차이를 결정한다. 기록이나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면 아픈 영혼, 갇힌 영혼에서 회복되고 해방되어 건강한 정신으로 자신의 주위를 빛나게 할 수 있다.
스포츠는 생각하며 몸으로 하는 철학이다. 스포츠는 단순히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유와 성찰을 요구한다. 스포츠를 철학하면 우리도 이민자로서 힘들지만 루게릭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고 고백할 수 있다. 철학과 스포츠의 연대적 상생이 ‘신을 잃어 버린’ 허무주의 시대에 방황하는 인생이 의미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다. 거창한 업적만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 된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