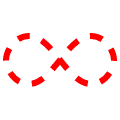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세상만사]
기우제 고려 때 등장, 무당 땡볕에 세워 피해 속출
조선 기우제 제도화, 민심 안정, 권력 공고화 일환
가뭄 등 자연재해 빈번, 경신대기근에 100만 사망
강릉사태는 人災, "가뭄보다 정치인이 더 큰 재앙"
고려 때 등장한 기우제
고려 충숙왕 16년(1329년), 가뭄이 극심해지자 무격, 즉 무당과 박수가 기우제에 대거 동원됐다. 뙤약볕에 세워 비 올 때까지 춤 추고 기도를 올리게 하는 폭무기우(曝巫祈雨)가 이어지자 무당들은 엿새 만에 도망쳤다가 붙잡혀 가혹한 형벌을 당했다.
◇ 폭무기우는 접신한 무당에게 고통을 주면 하늘이 불쌍히 여겨 비를 내려준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 제사였다. 하지만, 그 속내는 따로 있었다. 비가 오면 왕의 지극 정성 덕분이라 선전하고 가뭄이 계속되면 그 책임을 애꿎은 무당들에게 떠넘기려는 정치적 계산이었다.
민심 안정, 통치 행위 활용
고대사를 보면 국가 차원의 기우제는 고려 성종 3년(984년)에 처음 등장하지만, 삼국유사에는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비를 다스리는 신하인 우사(雨師)를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다. 고조선 때부터 왕이 가뭄으로 불안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기우제를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에 들어 기우제는 공식 제도로 편입됐다. 왕은 정례 기우제 외에 가뭄이 들 때마다 종묘와 사직단에 가거나 지금의 시청 앞 원구단으로 나아가 제를 올렸다. 가뭄을 천자(天子), 즉 하늘의 아들인 왕 자신에게 하늘이 내린 벌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의 기우제에도 고려 때처럼 천대받던 무당이 동원돼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이는, 그만큼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선왕조 519년 동안 가뭄이 보고된 사례는 419회로, 1.2년당 한 번꼴로 발생했다.
◇ 현종 때인 경술년(1670)과 신해년(1671)에 걸친 경신 대기근은 가뭄 등 풍수해로 인해 100만명이 굶어 죽고, 부모가 자식을 팔거나 아이의 인육을 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을 남겼다. 그 와중에, 서울에 전염병이 돌자 신하들은 영의정부터 말단 관료들까지 갖은 핑계를 대고 현종에게 사직서를 내는 등 '탈서울'에 바빴다.
"가뭄보다 정치인이 더 큰 재앙"
강릉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생활용수의 90% 가까이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이 값비싼 생수에 의존하고 폭염 속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임금이 부덕을 탓하며 제단에 무릎 꿇고 목놓아 빌었을 테지만, 지금 정치인들은 낯빛부터 다르다. 강릉 전체가 오봉저수지 하나에 의존하는 취약한 물 공급 구조와 여름철 관광객 폭증을 방치한 행정 무능이 작금의 사태를 일으켰는데도 그들의 모습에선 반성이나 책임 의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천재지변 앞에서 애꿎은 무당을 희생양 삼고 한가하게 공자왈, 맹자왈 하던 고려·조선의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인공지능의 극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민초들은 '하늘 탓'을 반복하는 후진 정치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다. 어찌 보면 맹렬한 기후변화보다 이를 알면서도 혈세만 축내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앙일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