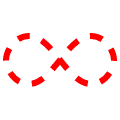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인&아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과 북러, 북중 정상회담 등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집권 1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그는 3일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왼쪽에 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오른편에서 열병식을 관람한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 의전이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반미(反美) 연대'의 상징적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 바깥 세계로 나온 은둔의 독재자
시 주석은 열병식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게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톈안먼 망루로 향하는 길에 세 정상은 나란히 걸으며 담소를 나눴고, 기념 촬영에서도 김 위원장은 시 주석 곁을 지켰다. 의전은 메시지다. 중국이 주도하는 반미 결속의 자리에 김 위원장을 한 축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이는 앞서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연상케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은둔의 독재자', '국제 왕따' 이미지에서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 변모한 듯한 착시 효과를 얻었다.
■ 러시아 ‘혈맹’, 중국 ‘경헙’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 지원은 형제의 의무"라며 혈맹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전을 언급하며 "영웅적 전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포옹까지 나누며 밀착을 과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호혜적 경제협력과 경험 교류를 요청했다. 중국은 북한을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북중러 3자 회담은 불발됐다. 북러의 혈맹 강화, 북중의 경협 모색은 확인됐지만, 세 나라를 제도적으로 묶는 틀은 부재했다. 세 정상 간 정치·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안러경중' 투 트랙 전략
전망도 엇갈린다. 이번 북중러 정상의 망루 동반을 반미 연대를 고리로 한 신냉전 구도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 협력)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며 외교적 난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략적 파트너로까지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파병 등에 따른 북중 간 내재한 긴장은 가려졌을 뿐이다. 실제로 북중러 협력은 양자관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미일처럼 제도화된 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승절에서 세 정상의 이미지는 강렬했으나, 협력의 실체는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게 이번 무대가 외교 전환점이 될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한국의 어깨는 무겁다.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 북중러 밀착이 눈앞에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도 안갯속 형국이다. 한국으로선 북중러 결속 구도가 굳어지면 외교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러와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 하는 역설적 과제에 직면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는 곧 한국 외교의 시험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