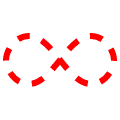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인사이드]
새로 부상한 권력은 라이벌인 정적(政敵)을 박해한다. 조선 시대에는 정적을 처단하기 위한 '살생부'(殺生簿)가 수시로 등장했다. 이 중 대표적 사례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정안대군 이방원이 반대파인 정도전·남은·조준 등을 살생부에 올려 제거한 것이다. 이후 각종 사화(士禍) 등에서 살생부가 거론됐다. 근·현대 정치적 숙청 사건에서도 살생부는 형태를 달리해 이어졌다.
블랙리스트(Black List)는 현대판 살생부다. 권력은 정적을 식별하고 기록한다. 특정 사상이나 비판적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명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매카시즘은 1950년대 미국에서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주도한 반공주의 운동이다. 할리우드 배우·작가들이 무더기로 '친공(親共) 의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망명길에 오르기도 했다. 이른바 예술인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는 이름 자체가 낙인이고, 그 낙인은 생존을 위협한다. 겉으로는 법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보복이다.
▶법의 이름 빌린 '정치 보복'
현재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 2023년 저서 <정부의 깡패들>(Government Gangsters)에서 '딥스테이트 회원 60인'을 적시한 게 화근이 됐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회고록을 쓰고, 최근 미·러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 후 FBI는 볼턴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명단에 오른 다섯 번째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파텔은 '국가를 무기화한 자들'의 기록이라고 주장했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정적 명부로 해석한다.
문제는 블랙리스트가 숙청과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정적을 기록한 블랙리스트가 수사의 근거로 작동한다면, 민주주의 제도는 허울만 남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향해 '저급한 인생'이라 비난하고, FBI가 그 이후 움직였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식 보복 정치'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력이 정적을 명부에 적고, 정부기관이 그 명부에 맞춰 조사에 나서는 구조는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에 다름 아니다. 이는 결국 보복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정권마다 반복된 사찰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과거 정권마다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시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정치적·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살생부는 시대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살아 있다.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권력은 계속 명단을 만들고 사회는 균열을 겪을 것이다. 정녕 서로 다른 목소리를 제도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정치 문화는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