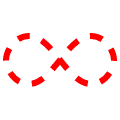인도·러시아·글로벌 사우스 등 딥시크 적극 지원 분위기
中 내부서도 밀어주기…지방정부·기업·기관 등 앞다퉈 도입
전문가 "저비용 고효율의 딥시크가 AI서 '민주화' 달성"
중국이 자국에서 개발된 '저비용 고효율'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본과 주요 서방 국가들이 딥시크 서비스를 제한한 가운데 러시아 등 친중 성향 국가들과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도국), 인도 등은 딥시크를 적극 도입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속에 중국 내부에서는 정부와 정보기술(IT)기업만이 아니라 금융계와 교육기관까지 나서 '토종 AI' 밀어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美패권 틈새 파고드는 中…"선진국·개도국 간 기술격차 해소에 도움"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딥시크의 대형언어모델을 자국 서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T 강국인 인도는 그간 비용 문제로 AI 관련 투자 개발이 더뎠으나 딥시크를 도입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앞서 러시아의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딥시크의 코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딥시크 사용 독려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의 레오 리우 빈싱 국제 비즈니스 부사장은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차이나 콘퍼런스'에서 "(딥시크의 등장은) 말레이시아의 스타트업들에 매우 좋은 기회"라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프리카에서도 딥시크의 AI 기술이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SCMP는 짚었다.
미국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탕 교수는 "저비용 고효율의 딥시크 모델이 AI 개발 분야에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에 기고했다.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고급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앞세워 AI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가 국경을 넘어 중국의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특히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들을 보면 2013년 중국이 서방 중심 질서에 도전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미 패권의 약한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정보 유출 우려' 명분 뒤엔 '친미·반중'…"기술성과 공유하는 中…거부하는 서방"
지난달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속도만큼이나 세계 각국의 딥시크에 대한 차단 또한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로 딥시크 서비스를 제한하는 국가들이 급속히 늘었다.
한국은 지난 15일부터 딥시크의 신규 앱 다운로드를 아예 차단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정부 기관을 비롯한 주요 부문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의 민진당 정부는 이미 지난달 공공부문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딥시크 차단 대열에 합류한 국가 중에는 미 동맹국이거나 반중 성향 국가가 많다는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보이콧은 매우 이례적이며, '딥시크 찬반 노선'을 두고 마치 세계가 둘로 쪼개진 듯한 인상마저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댜오다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 소프트파워의 핵심은 다른 나라와 기술적 성과를 기꺼이 공유하려는 태도에 있다"면서 "서방 국가들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토종 AI' 띄우기 총력전 나선 中…시진핑도 가세
중국 내부에서는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토종 기업에 힘을 실어줬다.
베이징시와 광저우시, 톈진시, 선전시 룽강구, 장쑤성 쿤산시 등이 앞다퉈 딥시크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딥시크를 활용해 문서 교정 등 단순 업무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실종자 찾기나 교통 체증 해소 같은 대민 서비스를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에 있는 현지 기업들이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딥시크 서버를 활용해 서비스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웨이신·微信)이 딥시크를 탑재하고 대화 내용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 주요 IT 기업들도 딥시크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증권사 약 20곳이 한 달 내로 딥시크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배포한다고 발표했으며, 교육기관들도 딥시크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종 AI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딥시크를 필두로 불붙은 'AI 굴기'에 중국 내부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 17일 민영기업심포지엄(좌담회)을 주재하고 중국의 IT·테크 거물들에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는 세계를 뒤흔들고도 은둔 행보를 이어온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물론, 그간 중국 정부에서 탄압받아온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정부의 띄워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좌담회 다음날인 지난 18일 중국중앙TV(CCTV)의 메인 뉴스에서 이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왕촨푸 BYD 회장,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은 인터뷰에서 좌담회를 통해 큰 격려를 받았으며, 중국 제품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일 것을 다짐했다고 충성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