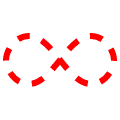전문가들 "경북 산불 피해지, 2∼3달 뒤 산사태 위험" 경고
"장마철까지 시간 많지 않아" "취약지 선별해 대책 세워야"
"뿌리가 없는 산은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경북 산불'의 큰 불길이 잡히고, 화마가 지나간 곳은 마치 화산지대처럼 새까맣게 그을렸다.
그 자리에는 '시간차 재난'이란 이름의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고 경고한다.
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채희문 교수는 1일 연합뉴스에 "산불이 지나간 백두대간 자락에 2∼3달 뒤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호소했다.
채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건조하지만, 여름이 되면 집중 호우가 내리게 된다"며 "산불 발생지에 응급 복구를 안 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불은 꺼졌지만, 산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며, 2∼3달 뒤 장마철과 겹치면 재난이 산불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경고다.
김성용 국립경국대 산림과학과 교수 역시 "숲에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비가 조금만 내려도 토사가 다 쓸려 내려오게 된다"며 "산 계곡부 골 주변으로 물이 다 모이는데, 나무들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물이 많이 쓸려 내려오는 유역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역에 큰 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며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복구해야 하고, 산림청 조사복구단은 기존의 정밀한 조사 방식을 바꿔 위험 지역이나 취약지를 선별해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일 위험한 곳만 빠르게 조사하고 그곳에 제방을 쌓거나 사방댐 등 골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며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대 등 소형 구조물들을 많이 쌓아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년 전 경북 예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거론하며 "임도에 제대로 된 크기의 배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작게 만들어놨다"며 "시공과 설계 자체가 달랐던 사례"라고 비판했다.
산림청은 주불 진화 직후 대형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재난 방지를 위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 기술사 등 전문가 280여 명과 초기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진단을 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시행하는 중앙합동 조사에는 국립산림과학원도 참여한다.
이들은 산사태를 막기 위해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민가 주변에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박사는 "산불영향 구역이 너무 방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 복구 구조물을 시공해야 한다"며 "산불 경계지 주민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산사태 위험 지도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의성=연합뉴스)김선형 기자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