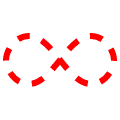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인&아웃]
퇴직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전자레인지 사용을 놓고 눈치를 본다. "전기료 많이 나온다"는 눈총 때문이다. 입주민 '갑질'에 맞서기도 어렵다. 마찰이 생기면 해고 압박을 받으니 참아야 한다. 국내 아파트 경비원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300세대 미만 단지와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약 150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비원은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생계형 노동이며,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노인 10명 중 4명 빈곤
연금 수급 사정도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70만 원, 최저생계비의 반토막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60세 전후의 '소득 절벽'이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은 끊겼지만, 국민연금 개시 연령(63세)에 이르지 못한 60∼63세 중 절반 이상은 연금이 전혀 없다. 월평균 100만 원 안팎을 받는다는 수치가 있지만, 이는 일부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실제로는 무연금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많다. '노후 보장'은 장밋빛 구호일 뿐이고, '노년 빈곤'은 씁쓸한 현실이 됐다.
▶범죄로 이어지는 노년 빈곤
노년 빈곤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전체 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특히 살인·절도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절반 가까이가 무직이었고, 상당수는 초범이었다. 범죄 전력이 없던 고령자들이 생계 압박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기대했던 안정적 노후와 현실 간 격차, 가족 해체와 사회적 단절을 겪으면서 파생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노인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일부 고령자들을 절망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60세 넘는 순간 '노인 취급'
문제의 본질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0대 이상을 '잉여 인간'으로 인식하는데 있다. 평균 기대수명은 83세, 건강수명도 크게 늘었지만, 기업은 50대 후반이면 공공연하게 퇴직을 종용하는 실정이다. 60세를 넘는 순간에는 사회적으로 노인 취급을 받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 공백기에 무연금 상태로 퇴직금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60대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노년은 이제 더 이상 은퇴와 동의어가 아니다.
▶고령화, 사회적 부담? 자산?
전망은 결코 밝지 않지만, 과제는 분명하다. 우선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초연금도 가장 취약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도 시급하다. 아울러 고령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멘토링, 사회적 경제 영역의 양질 일자리 창출도 병행돼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지, '자산'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