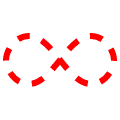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인&아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관문이다. 체계·자구를 다듬는 품질 보증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법사위 위상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릫, '상원릮으로 통한다. 각종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의 최종 '게이트 키퍼'
법사위원장은 회의 개최·안건 상정·본회의 회부 여부권을 쥐고 있다. 입법의 릫최종 게이트 키퍼릮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1948년 제헌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조문별 심사·표결을 거친 뒤 수정이 있으면 법사위에 단순 자구(字句) 정리를 의뢰했다. 1951년부터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치도록 바뀌었다. 형식·체계 점검이 본령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 심사로 확장됐다. 13대∼16대 국회까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나, 17대부터 제1야당 몫으로 굳어졌다. 명분은 견제였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관례를 깼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것이다. 16년 관행이 무너지면서 법사위는 갈등의 전장이 됐다.
"윤석열 오빠에 무슨 도움?"
최근 법사위 회의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맞붙은 '추나대전릫이 대표적이다. 여당이 나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지난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발언이 튀어나오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법사위는 이어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불출석 시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당 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법부 흔들기 논란과 당내 역풍 우려가 겹치자, 법사위가 독자플레이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사위는 '법을 죽이는 위원회'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가. 원인은 구조에 있다.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이다. 각종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멈춘다. 체계·자구 정리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론 법안 내용을 문제 삼기도 한다. 여야가 이러한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는 까닭이다. 여야 지도부가 강경파 의원들을 기용하는 관행도 한몫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법사위에 대거 배치된 것도 정쟁의 무한루프가 됐다. 공천을 위해 선명한 투사로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법사위는 '법을 죽이는 위원회(法死委)'"라는 냉소도 나온다.
4류 정치 '정쟁의 무대'로 추락
차제에 법사위 개혁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상임위별 자율성을 보장하자고 한다. 국힘은 심사 기한을 두고, 이를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단계적 축소를 주장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같은 독립기구로 법제 검토 기능을 이관하자는 방안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에서 맡아야 할 기능이란 주장까지 있다. 어찌 됐든 법사위가 계속 정쟁의 무대에 머문다면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다.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