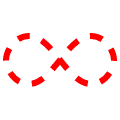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세상만사]
국내 대학에서 정년을 마친 이공계 석학이 외국 대학으로 옮겼다는 소식은 이제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눈길이 간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노 교수의 외국행이 계속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다. 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 대가인 송익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UESTC) 기초 및 첨단과학연구소 교수로 부임했다고 한다. 송 교수는 1988년 28세로 KAIST 교수에 부임해 당시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웠고, 37년간 KAIST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정년퇴직했다.
KAIST 최연소 교수의 中 선택
지난해부터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HCR 석좌교수, 김수봉 전 서울대 교수 등 정년이 지난 석학들이 잇달아 중국으로 떠나면서 두뇌 유출을 막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직 이런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송 교수가 퇴임 후에도 계속 연구하기 위해 중국 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KAIST에도 '정년 후 교수' 제도가 있지만 연간 연구과제를 3억원 이상 수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다만 순수이론 분야는 3억원 이상 수주 조건이 면제된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송 교수가 중국행을 선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자긍심에 상처 준 예산 삭감
석학들의 외국행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지난해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지목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은 젊은 연구자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줬다. 이런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 실직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고용노동부 자료도 최근 공개됐다. 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복원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계에 남은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이고 연구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기술 혁신에 매진할 생각이 들까 싶다.
유학생들의 脫 미국 고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인력 고용을 위해 발급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하자 탈(脫)미국을 고민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일단 취업 후 H-1B 비자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비자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 미국 기업들이 더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기업들의 외국인 전문직 고용이 그만큼 어렵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
세계 각국은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을 인재 확보의 기회로 삼을 태세다. 영국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트럼프 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지만 앞으로 검토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영국 언론이 분석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석좌교수 정년 연장
젊은 글로벌 인재 유치만큼이니 국내 석학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연구 역량을 키워온 노 교수들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원이다. 그들이 정년 걱정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좀 더 힘을 쏟았으면 한다. 때마침 서울대가 정년에 따른 석학 유출을 막기 위해 우수 석좌교수 정년을 65세에서 최대 75세로 연장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들이 조국에 남아 연구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좋은 연구환경과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중국을 언제까지 부러워하고만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