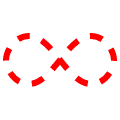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4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경제활동의 허리인 4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줄곧 암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40대가 늘어난 것은 경제적 요인을 비롯해 한국 사회의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핵심이 중장년층 자살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자살률(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6.6%) 늘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30대가 30.4명으로 전년(26.4명) 대비 14.9%나 증가했다. 다음으로 40대(36.2명)가 전년(31.6명) 대비 14.7%, 50대(36.5명)는 전년(32.5명) 대비 12.2%가 각각 늘었다. 이는 20대(1.6%)와 60대(3.9%) 등 다른 연령층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30∼50대 경제활동 핵심 계층의 자살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다.
중장년의 자살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양상도 여전하다. 지난해 성별 자살 증가율은 남성(9.1%)이 여성(1.0%)보다 높고, 자살자 수도 전체 1만4천872명 가운데 남성이 1만605명으로 여성(4천267명)의 2.5 배에 달했다. 연령별 자살률에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 10대에서는 여성이,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다. 특히 중장년층 자살률 남녀 차이가 큰데 30대가 39.5명 대 20.4명, 40대는 51.1명 대 20.9명, 50대는 54.9명 대 17.8명이다. 자살 증가율도 성별 격차가 크다. 특히 50대에서는 남성(15.7%)이 여성(2.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인생에서 중장년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책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주어지는 책임이 무겁다. 중장년층은 어떤 이유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장년 남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지만 여성들은 정신 건강 문제로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중장년 남성에게 경제적 책임이 더 많이 부과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다. 박종익 강원대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의 자살률이 올라간 것은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자살률에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도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수십 년째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중장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는 불평등 해소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명민 백석대 교수는 '중장년의 자살 문제와 사회적 과제'(2023년)라는 글에서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이라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 성별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오지 못한 결과가 많은 중장년 성인이 자연적 본성에 반하여 스스로를 낙오자로 규정하며 목숨을 끊게 하는 사태를 빚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장년 자살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삶이 힘들고 버겁다. 가족을 혼자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그런데도 고민을 선뜻 털어놓을 수 없는 고립감이 가슴을 더 죌 것이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그들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