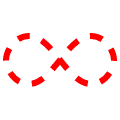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인&아웃]
'영욕 78년' 검찰 간판 내린다
검찰은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탄생했다. 검찰은 헌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보장받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이러한 강력한 권한은 경찰의 권한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라는 사명이었다. 검찰은 출범하자마자 권력의 압력을 받았다.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기소했다가 끝내 검사장이 옷을 벗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지시를 어겼던 검찰총장은 좌천 등의 시련을 겪었다. 권력과의 긴장은 검찰의 숙명이 됐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
검찰은 어느새 권력기관으로 성장했다.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한 손에 쥐고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압박하며 자신을 '국가 그 자체'로 과장했다."(『검찰공화국, 대한민국』) 특히 전·현직 대통령, 고위 관료, 재벌 총수를 수사·기소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특별수사의 꽃'이라 불리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힘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낳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의 칼날은 비극을 낳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세해 토론은 종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내년 9월 간판을 내린다.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담당한다. 검사 2천300명, 수사관 7천800명 등 1만여 명의 인력은 재배치된다. 이로써 제헌헌법에 명시됐던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오랜 논쟁이 검찰 해체라는 극단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
▶개혁의 대상이자 불신의 상징
아닌 게 아니라 검찰은 오랫동안 개혁의 대상이자 불신의 상징이었다. 권력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고 내부 비리에 눈감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개혁 요구에 따라 파생된 결과물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로 파면된 지 100여 일 만에 검찰은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아이러니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을 감시하던 조직이 스스로 권력화되면서 제어 불능에 빠졌고, 결국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셈이다. 검찰의 영욕 78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수사 보완 요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88%는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보완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가 범죄 대응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중수청의 권한남용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수사의 칼날은 부조리와 비리를 겨누는 도구여야지, 권력 그 자체가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