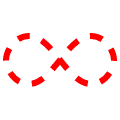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이코노워치]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이다. 두 나라가 서로 필요에 의해 미리 정한 환율로 각국 통화를 교환했다가 일정 기간 뒤 원금을 다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거래가 중앙은행 간의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아 금융위기처럼 신용경색으로 외화유동성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돼 주가나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 스와프를 가동하면 시장의 불안과 충격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두차례 금융시장 안정 효과
한국은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과 10건의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한도가 없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1천482억달러 규모다. 미국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돼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던 2008년 10월 30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연준은 당시 한국을 비롯한 14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0년 대부분 종료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던 2020년 3월에 규모를 600억달러로 늘려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 이 계약도 이듬해 말 종료됐다. 2차례 모두 계약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진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당시처럼 위기 상황도 아닌데 난데없이 한미 간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소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외신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달러(약 490조원)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대응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천162억9천만달러였는데 여기서 약 84%에 달하는 3천500억달러를 쓰면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충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같은 대비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성을 갖는다.
■비기축통화국의 위기
통화스와프가 관심을 끈 것은 대개 경제위기로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나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위기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나 금융시장의 충격이 없는데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비기축통화국의 처지가 부각되는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미국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를 일본에 비교하곤 하지만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크게 다르니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처지가 아니다. 지난달 말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우리의 3배인 1조3천44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데다 기축통화국이어서 미국 연준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쉽지않은 합의 절충
미국 연준은 달러 부족 사태가 파급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비기축통화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으니 무역 협상과 연계한 스와프 계약이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에도 우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희망했었으나 연준 요건 등 여러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어렵사리 합의점을 찾은 한미 간 무역 협상의 불씨를 꺼트릴 수도 없으니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무역 합의를 성사시켜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일본과 같은 15%로 낮춰야 할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향후 이어질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게 되겠지만, 미국과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않다. ‘난제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