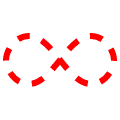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관세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미국 CNN 방송은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원산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애플 아이폰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면 삼성전자 갤럭시폰은 베트남과 인도, 한국 등에서 생산된다고 짚었다.
애플은 인도 등으로 아이폰 생산시설을 일부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핵심 생산기지다.
웨드부시 증권에 따르면 아이폰 생산의 90%가량이 중국에서 이뤄진다. 나머지는 베트남·인도가 5%, 기타 국가가 5%씩을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왔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50∼60%가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그다음이 인도·한국·남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중국 휴대전화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 점유율을 내준 뒤 2019년 중국 내 휴대전화 공장을 닫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이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90일간 이를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상호관세를 포함해 총 145%의 관세를 추가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베트남 46%, 인도 26%, 한국 25% 등이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상태다.
앞서 스마트폰에 상호관세가 적용됐다면 중국산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가격이 800달러(약 114만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상호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헤릿 스니만 선임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 의존하지 않지만 즉시 수혜를 볼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가격 인상이 충성도 높은 애플 고객들의 마음을 흔들지도 불분명하다.
스니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애플에서 삼성전자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경기 둔화 시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져 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테크인사이츠의 린다 수이는 애플이 미국 수출용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옮길 수 있다고 봤다.
자산운용사 퀼터체비엇의 벤 배린저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가전제품과 함께 디스플레이·메모리·반도체 등 부품도 만든다면서 "세계적으로 드물게 수직 통합된 기업인 만큼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고가의 프리미엄폰 시장에 주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bs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