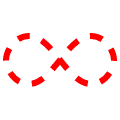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태평로]
프랑스 혁명에 기여한 나폴레옹은 역설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잡고 황제에 오른다. 프랑스 국민이 왕정을 민주정으로 바꾸려 했으나 수많은 살육과 무고한 희생 끝에 오히려 황제정으로 퇴보한 것이다. 이는 머릿속 의도와 실제 결과가 일치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일깨운다. 이 시기에 '르 모니퇴르 위니베르셀'이란 신문도 유력지로 급성장했다. 나폴레옹이 연합군에 패해 엘바섬에 유배됐다 탈출해 복위하던 과정에서 이 신문과 얽힌 일화는 언론이 권력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는 사례로 종종 거론된다.
'현재 권력'에 약한 기성 언론
1815년 2월 말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탈출해 황제로 돌아오기까지 근황을 다룬 르 모니퇴르 머리기사는 카멜레온의 변신을 뺨친다. '식인귀, 엘바 소굴 탈출 → 도깨비, 프랑스 남부 상륙 → 호랑이, 카르푸 항 출현 → 괴물, 그르노블 야영 → 폭군, 리옹 도착 → 찬탈자, 수도서 100㎞ 지점 출현 → 보나파르트, 북진 중이나 파리 입성 불가 → 나폴레옹, 내일 파리 도착 → 황제 나폴레옹, 퐁텐블로 궁 도착 → 황제 폐하, 파리 튈르리 궁 환궁'. 식인귀가 괴물, 폭군 등을 거쳐 폐하로 다시 불리기까지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다. 도를 넘는 원색적 비난이 낯부끄러운 노골적 찬양으로 표변한 이유는 단 하나, 나폴레옹이 쥔 권력의 크기이니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인간의 본성을 새삼 확인시킨다.
다행히 이 일화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 실제 보도는 아니라고 한다. 허구가 사실처럼 여러 매체에서 인용됐던 건 우리가 그 개연성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래 언론이란 '현재 권력'에 약한 존재임을 다들 잘 인식한다는 의미다. 제4부로 불릴 만큼 스스로 권력기관이지만, 그 권력에 기생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논조가 변하던 모습을 봐 왔다. 이처럼 여러 외부 압력에 노출된 한계 탓에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졌고, 독자들은 이제 더 진실해 보이는 소식통을 찾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뉴 미디어가 급성장했고 기성 언론이 설 자리는 좁아졌다.
냉철한 균형감각 잃지 말아야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한 대표적 사례는 언론 통폐합이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이후 또 한 번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는 1980년 언론 통폐합을 단행했다. 적지 않은 신문·방송사가 사라지고 뉴스통신사는 하나가 됐으며, 지방지는 1도(道) 1사(社)가 원칙이었다. 매일 '보도지침'을 통해 기사 내용까지 통제했다. 서슬 퍼런 권력에 기성 언론은 순응했다. 극단적 사례였으나 정도와 방법 차만 있을 뿐 이후 들어선 정권들도 언론을 통제하려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권력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총칼과 직접적 공권력 행사만 무서운 건 아니다. 광고 수주 영향력 행사, 세무 조사, 외부 집단의 개입과 압박, 신규 매체 유도, 친정권 매체 지원, 법규 개정을 통한 새 판 짜기, 언론인 직접 제재와 손해 배상 강화 추진 등 부단한 시도가 이뤄졌던 걸 사람들은 기억한다.
공영 언론사들은 오너 체제인 언론사보다 정치권, 각종 단체, 이익 집단 등 외부 권력의 영향력에 더 쉽게 흔들린다. 공영방송 등에선 정권이 교체되면 경영진도 바뀌는 게 수순이었다. 속칭 낙하산 사장을 앉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국민은 어느 정파든 언론 관련 제도를 바꾸려 할 경우, 내세운 명분이 실제 결과로 입증돼야만 진실성을 믿어주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언론 통폐합도 가능했던 수십 년 전과 달리 이젠 권력이 정치권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사회가 분화하고 복잡해진 지금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권력 주체가 미디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권력만 견제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결국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구성원들이 외부 간섭을 차단한 채 스스로 냉철한 균형감각과 자정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확보될 수 없다. 기성 언론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미 번성기에 접어든 '1인 미디어'에 완전히 밀려나 과거 공룡 같은 멸종 생물로 기억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