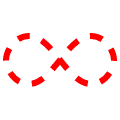전체 성씨 5천개 넘어…초창기 정치·사회 지위 상징, 왕족 및 귀족만 사용, 고려 시대부터 정착
[집중분석/우리나라 '성씨']
金 1168만명 1위, 李 730만명, 朴 419만명 등 순
'김·이·박'씨 절반…본관 김해 김씨 445만명 최다
다문화 가정·호주제 폐지 창성창본 허용 성씨 늘어
한자 이름 감소·한글 이름 증가 성씨 트랜드 변화
외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해 말할 때 왜 이렇게 '김(Kim)'씨가 많냐고 자주 얘기한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꼴로 김(金)씨인 게 사실이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한국인하면 '김'이라는 성씨가 가장 익숙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김씨뿐만 아니라 무려 5천개가 넘는 성씨가 있다고 하는 게 과연 사실일까. 한국인에게 성씨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조선시대에 평민까지 사용 보편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씨의 유래는 삼국시대 이전의 경우 원래 성(姓)은 어머니의 혈통, 씨(氏)는 조상이나 출신 지역을 의미했고 초기에는 왕족과 귀족만이 성씨를 사용했다.
삼국시대 들어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자 성씨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고구려 장수왕, 백제 근초고왕, 신라 진흥왕부터 성씨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극(克)씨, 중실(中室)씨, 위(位)씨, 해(解)씨, 목(穆)씨를 비롯해 신라의 박(朴)씨, 석(昔)씨, 김(金)씨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성씨는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고려 시대 들어 성씨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됐다. 태조 왕건이 전국 군현별로 토성(土姓)을 나누면서 성씨 체계가 확립됐고 귀족과 관료층에서 점차 양민 층으로 성씨 사용이 확대됐다.
조선시대 들어 성씨 사용이 더욱 보편화됐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평민까지 사용했고 최하층 계급이었던 노비 등은 1894년 갑오경장 직후에 제정된 '민적법'에 의해 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이뤘다.
◇곰, 굳, 길란 등 1인 성씨 3천여개
세계성씨연맹에 따르면 1486년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는 277개 성씨, 영조 때 이의현이 편찬한 도곡총설에는 298개 성씨, 1930년 조사에서는 250개 성씨, 1960년 조사에서는 258개 성씨가 있었으며 198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는 274개의 성씨가 확인됐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성씨·본관 편'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성씨는 5천582개며 이 가운데 한자가 있는 성씨는 1천507개, 그 외 성씨가 4천75개였다. 인구 1천명 이상인 한자 있는 성씨는 153개로 전체 인구의 99.8%인 4천958만여명이 쓰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남산 위에 올라 돌을 던지면 김씨 또는 이씨, 박씨 중에 한명이 머리에 돌을 맞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 중 4~5명은 이들 3대 성씨다.
이중 김씨는 1천68만여명으로 단연 1위였고 이씨가 730여만명, 박씨가 419만여명으로 이들 3개 성씨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4천970여만명 중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 3개 성씨에 이어서는 최(崔)씨(233만여명), 정(鄭)씨(215만여명), 강(姜)씨(117만여명), 조(趙)씨(105만여명), 윤(尹)씨(102만명), 장(張)씨(99만여명), 임(林)씨(82만여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 1천명 이상인 한자 성씨 중 가장 적은 성씨는 도씨로 1천37명이었고 당(唐)씨(1천146명), 건(乾)씨(1천251명), 소(邵)씨(1천309명), 호(胡)씨(1천494명), 단(段)씨(1천612명), 진(陳)씨(1천740명)로 각각 2천명을 넘지 못했다.
본관의 경우 김해 김씨가 445만여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았으며 밀양 박씨(310만여명), 전주 이씨(263만명), 경주 김씨(180여만명), 경주 이씨(139만여명), 진주 강씨(96만여명), 경주 최씨(94만여명), 광산 김씨(92만여명), 파평 윤씨(77만여명), 청주 한씨(75만여명)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한자 성씨를 포함해 우리나라 성씨는 2000년 728개에서 2015년에는 거의 8배나 늘었다.
매우 독특한 성씨도 있다. 음식 관련 성씨인 어(魚)씨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성씨로 배우 류수영의 본명이 어남선이다. 감(甘)씨는 '달다'는 뜻을 가진 성씨로 배우 감우성이 대표적이다. 복성(複姓)도 희귀한데 남궁(南宮)씨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씨로 배우 남궁민이 있다.
멘, 분, 속 등 10명 이하의 소수 성씨가 4천여개에 달하며 곰, 굳, 길란 등 1인 성씨도 3천여개에 이른다. 긴 성씨로는 프라이인드로테쭈젠덴과 알렉산더클라이브대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계 희귀 성씨로는 골라낙콘치타, 귈랑로즈, 일본계 희귀 성씨로 고전(古田), 길강(吉岡)도 있다.
◇자녀 선택권 확대 후 모계 성씨 증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늘어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다문화 가정 확산으로 귀화자가 늘고 2008년 호주제마저 폐지되면서 법원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창성창본'(創姓創本)을 허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귀화자의 경우 '김·이·박' 등 한국인이 주로 쓰는 성씨를 따라 쓰고 거주지를 본관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몽골 김 씨, 태국 태 씨처럼 출신지를 본관으로 삼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독일 이씨의 시조인 이참(베른하르트 크반트)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영도 하씨를 만든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씨 등이 창성창본의 주요 사례다.
귀화 성씨는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적지 않았다. 귀화인들의 출신 국가도 중국, 일본뿐 아니라 인도, 베트남, 네덜란드 등 다양했다.
조선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성씨 277개 가운데 절반가량인 130여 개가 귀화 성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기 42년 금관가야를 건국한 김수로왕은 바다를 건너온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배필로 맞아 7남 2녀를 뒀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성을 따라 김해 허씨가 됐다.
베트남에서 이주한 왕족도 있다. 13세기 리 왕조의 마지막 왕자 리롱뜨엉은 고려로 망명해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는 공을 세우자 고종은 지금의 황해도 금천군 지역인 화산 땅을 식읍으로 내려주고 화산군으로 봉했다. 그는 이름을 이용상으로 바꾸고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됐다.
원나라 공주를 따라온 위구르계 장순룡은 덕수 장씨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조선시대에 많은 명신을 배출한 거창 신씨도 고려 문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귀화한 신수의 후손이다.
여진족 퉁두란은 고려에 귀화해 이씨 성을 하사받아 청해 이씨의 시조가 됐다. 이름을 이지란으로 바꾼 그는 이성계가 왜구들과 벌인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고 위화도 회군 때 일등 공신으로 뽑혀 조선 건국에 힘을 보탰다.
1627년 조선 땅에 도착한 박연(벨테브레)의 원산 박씨, 하멜 일행 중 한 명이 시조인 것으로 알려진 병영 남씨는 네덜란드계 귀화 성씨다.
◇성씨 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시급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씨 트렌도 바뀌고 있다.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성씨 선택권이 확대된 이후, 2020년 기준 신생아의 12.3%가 모계 성씨를 계승했다. 부모가 다른 성씨인 경우 전체의 89%가 모계 성씨를 택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관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0~2024년 인공지능(AI) 작명 서비스 데이터 1천200만 건을 분석했더니 전통 한자 이름 비율이 전체의 78%에서 43%로 감소했지만 한글 표기 이름은 54%로 늘었다.
통계청 마이크로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30년 김씨의 비율이 전체 성씨의 19.8%로 감소하고 기타 성씨 비중이 41.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73%가 부모 성씨를 결합하거나 새로운 성씨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 속에 성씨 문화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하며, 희귀 본관의 소멸 방지를 위한 유전자 은행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