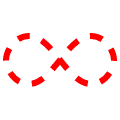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인&아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적 양극화가 낳은 샴쌍둥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관점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정치가 법원 판결에만 너무 기대면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사법부가 정치화되면 다시 정치세력이 법원을 더 많이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 재검표 중단을 결정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표적인 정치의 사법화다. 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된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도 대통령과 총리·장관 등 고위공무원의 탄핵 심판과 같이 중대한 정치적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나 검찰 수사권 분리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법과 정치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이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된다. 중요한 정책에 대한 강경 대치는 법정 다툼으로 전환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정쟁은 사법부마저 전쟁터로 끌어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에만 기대는 결정장애 증후군에 빠져 있고, 사법부는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신경 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 기능을 상실하고,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정치의 사법화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의사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을 낳는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리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 이념적 분열이 심화하면 판결의 신뢰성은 극도로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형해화되고, 책임은 서로에게 전가되며, 법은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은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 갈등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정치와 법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제자리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이나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 제고, 사법부 내부의 다양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입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유권자 심판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