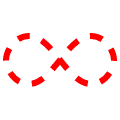李대통령 '선제적·단계적 복원' 언급…북한 호응 여부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효력이 정지된 군사합의 복원 절차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첫 선제적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중단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취임 후 우리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접경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도 이어졌다.
9·19 군사합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9·19 군사합의의 공식 명칭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고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접경지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방송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9·19 군사합의 복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통한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지난해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재개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도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군 사격 및 기동훈련 등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은 지속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침은 없는 상태"라며 "확성기 방송 중단과 달리 훈련 중단을 위해서는 군사합의와 관련한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에서, 일부 효력 정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례를 고려하면, 군사합의의 일부 혹은 전면 효력 복원 결정을 내리려면 NSC 혹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남측이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북한의 호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합의 복원 노력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한 이후 남측과의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단행한 대북 긴장완화 조치를 평가 절하하고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