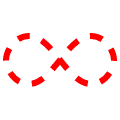[세상만사]
6·25의 잿더미 속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처럼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이었다. 병원은커녕 피임이란 개념도 없었다. 아들 선호 현상이 심해져 1959년부터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명을 넘자 박정희 정부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정관수술을 독려했다.
1970년대 적정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친 정부는 1980년대 들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로 낙태를 부추기까지 했지만, 허사였다.
▶1990대 산부인과 초호황
아들에 대한 집념은 많은 어머니들을 수술대에 오르게 했다. 시댁 조부모 제사상까지 차리는 고단함보다 '대를 잇지 못한 여자'라는 낙인이 더 무거웠던 탓이다. 1980년대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가 도입되면서 산부인과는 딸을 안 낳으려는 며느리들로 붐볐다. 병원은 떼돈을 벌었고, 유명 전문병원들은 의과대학까지 세웠다.
1990년, 한국의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6.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둘째는 117.1, 셋째는 3년 뒤 209.7을 기록했다. 성비 자연 범위(103~107)를 훌쩍 넘어선 숫자 속엔 세상 빛조차 보지 못한 여아들의 한이 담겨 있다.
아들 선호의 철옹성은 경제발전과 여성 권리 신장, 도시화와 핵가족화 속에 조금씩 무너져내렸다. 대학에 가게 되고 민주화를 경험한 여성들은 시집보다 취업을, 결혼보다 독신을, 자식보다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자기 딸들에게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들은 시댁과 거리를 두는 며느리와 처가 눈치를 보는 아들을 보며 "아들 키워봤자 소용 없다"고 탄식했다.
▶서울대 여학생 비율 50% 육박
한국이 '여아 선호 1위 국가'라는 통계가 나왔다. 44개국 대상 설문에서 '아이를 한 명만 가질 수 있다면'이란 물음에 한국인의 28%가 딸을 택했다. 아들을 선택한 비율은 15%로, 실로 격세지감이 든다. 딸 선호 현상은 현실을 반영한다. 노부모를 돌보는 역할이 장남에게서 딸과 사위로 옮겨간 지 오래다.
딸이 아들보다 부모 말을 잘 듣고 학업 성취도도 높다는 것도 딸 선호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공직사회의 통계를 보면 신규 판사와 변호사의 절반 이상, 부장판사의 40% 이상이 여성이고 신입 외교관은 이미 10년 전 70%를 넘었다.서울대 의대 여학생은 1980년대 10%대였지만 이제는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들이 남자만의 병역 의무와 각종 여성 할당제에 반발하며 보수정당으로 향하는 이유다.
▶이대남의 역차별 호소
이대남들이 "여자도 군대 보내라", "여대 로스쿨과 의대 문을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딸들과 무한 경쟁을 벌여온 아들들에게 여성 배려를 주문하는 민주화 세대 부모들은 그저 꼰대일 뿐이다. 그러고 보니 '여풍(女風)'이란 단어가 자취를 감췄고,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말해주듯 우리 사회의 성 문제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성소수자라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기성세대의 적응 속도는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 든다.